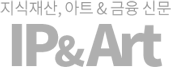룩셈부르크로 가는 심야버스를 타기 전에 중국식당에서 저녁을 많이 먹었다. 속이 좀 더부룩했다. 거의 11시간을 앉아서 이동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조금 일찍 탑승 게이트로 갔더니 이미 버스가 도착했다. 코펜하겐의 픽업 포인트(Pick Up Point) 수준의 버스터미널은 아니었다.
좌석번호가 없어서 검표원에게 물어 보니 자유석이란다. 2층 맨 앞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원 스위치도 있고 안전벨트도 사선형이다.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다. 의자 바로 뒤가 빈 공간이어서 뒤로 젖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감사할 일이고 행복이다.
이 버스는 베를린에서 룩셈부르크로 가는 심야버스이다. 날씨부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낮은 기온이기는 하지만 바람이 그리 심하지 않다. 몸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았다. 이 자리에 앉으니 버스 전체를 렌트한 것 같은 기분이다. 물론 기차보다는 못하지만 버스여행 역시 나름 묘미가 있어 보인다. 승용차를 렌탈하는 것 보다 훨씬 좋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에서 버스는 천대 받는 느낌이다.
유럽은 철도가 중심
유럽은 주로 철도가 중심이다. 도심 가운데 위치한 이른바 ‘중앙역’은 건물 자체가 크고 화려한 데에 반하여 버스터미널은 소박할 정도다. 코펜하겐처럼 노상의 픽업 포인트 형태의 터미널이 아닌 정류장 수준이다. 버스터미널이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역에 부속된 조그만 시설에 불과하다.
모처럼 식사를 많이 해서인지 자리에 앉아서 조금 지나서 잠이 쏟아졌다. 한참을 자고 나서 지도를 보니 쾰른 근처였다. 앞으로 3시간 정도를 더 가면 룩셈부르크에 도착할 것 같다. 가면서 곳곳을 둘러가는 데 안내 방송이 없다.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차 승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의아하다. 저녁 8시 30분경에 지도 등을 보면서 하차할 때 주의를 해야겠다.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승객 수가 꽤 많았다. 인상비평을 하자면, 승객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심야버스를 타는 각자의 사연이 서려있는 것 같았다. 부유하고 여유가 있다면 굳이 침대차도 아닌 버스에서 11시간 이상을 보낼 것인가?......힘든 삶에 대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얼굴표정 이전에 좌석에 누워있는 모습 자체가 삶의 찌든 모습이다. 물론 이는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의 사람들의 표정과 공항에서의 사람들의 표정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조명도 공항은 밝지만 터미널은 어둡다. 더불어 복장도 서민풍이다.
승객을 대하는 운송업체 직원들의 태도부터가 다르다. 버스 운전사나 터미널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항 직원이나 파일럿은 영어가 유창하다. 어쩌면 버스를 타고 가는 인생자체가 멍에로 느껴질 정도이다.
다만 관광객은 다르다고 본다. 버스를 통해 아름다운 전경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렌트카를 해서 다니는 것보다 더 이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힘이 덜 들고 나아가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 버스기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런데 어제 체크를 해보니 그간 많았던 버스 편이 거의 없다. 아마도 파업을 하거나 무슨 사정이 생긴 모양이다. 아니면 기차를 타야 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텐데 달리 뾰족한 묘책이 없을 것 같다.
3월부터 룩셈부르크 대중교통 요금 공짜
각자의 인생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유럽에서의 버스기행은 비록 열악하지만 기차 아니 비행기보다 장점이 많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큰 버스를 다소 불친절할지 모르나 기사까지 함께 렌트를 하였으니 이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보니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올라 온 적이 있었다. 물론 그 때 사법당국의 조사 등 좋지 않은 상황 등이었으나 버스의 선택은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유럽에서의 버스기행! 특히 2층의 제일 앞쪽 좌석에서의 버스여행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jpg)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변호사와 AI
변호사와 AI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