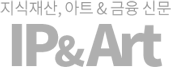조지아 트빌리시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체감 추위가 상당하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산 25라리(한화로 1만원 상당)의 외투가 유난히 돋보이는 날씨다. 필자의 일부가 된(?) 외투의 옷깃을 쓰다듬어 본다.
오늘은 시내투어 등을 포기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 보기로 한다. 카페 2층 창가로 내려다 보이는 트빌리시는 그저 촉촉하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비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뛰어 다닌다. 그리고 보니 여기에 피신을 잘 한 셈이다. 핸드폰과 노트북의 충전을 위하여 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본다.
문자 그대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다. 오늘 비행기는 밤 11시니 시간 여유가 있다. 그간 밀린 컴퓨터 작업도 재미가 있다. 여기는 비가 오는 데도 우산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물론 비가 아주 억수같이 내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겨울비여서 우산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추울텐데......마치 비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걱정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생뚱맞기는 하다.
만일 조지아 바투미에서 예레반, 그리고 트빌리시까지 버스여행을 강행했다면 좀 무리가 따랐으리라. 스스로 잘한 결정이라 자신을 다독여 본다. 대신 좀 무료하기는 하다.
조지아라고 하면 그저 슬로우 라이프만 생각날 뿐이다. 딱히 갈 만한 유적지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물론 찾아보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찾고 싶지가 않다.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그저 넋 놓고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외국의 패스트푸드점 등이 밀집된 거리이다. 전통음식점 등에 비추어 가격이 비싸지만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지 모르겠다. 관광객인지 현지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가끔 사진을 찍는 관광객이 보인다.
모처럼 가져 보는 여유이다. 그저 쫒기는 기분으로 명소 등을 쫒아 다닌 것 같다. 이제 귀국도 준비하고 나아가 이번 기행을 마감할 시점이기는 하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딱히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아직은 발전이 덜 된 나라고 과거에 실크로드의 한 지점이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과연 이 국가들에게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딱히 그 방향성은 없다. 그저 한번 돌아보고 그 가능성 등을 찾아보려고 할 뿐이다.
사실 한국과는 좀 멀다. 특히 육로 교통은 최악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의 중심국가로서 중요성이 있다. 그만큼 잠재력은 크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나라들임은 분명하다.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변호사와 AI
변호사와 AI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