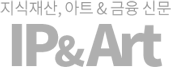저녁 8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7시까지 여행사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30분이 지나서도 오지 않는다.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하니 오늘은 너무 바빠 이곳에 들리지 못한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면서 여행사 직원의 말이 툭툭을 불러 줄테니 타고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느냐고 하니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 당초 이야기와는 다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없어 다툴 상황이 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터미널까지 가는 툭툭이 20만 깁. 한국돈으로 3000원 정도 되어 참기로 했다.
툭툭을 타고 가면서 시내를 바라보았다. 한국의 시골 읍면과 같았지만 나이트 마켓과 메콩강 주변엔 아름다운 건물과 카페들이 있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거의 시골의 버스정거장 같았다.
버스를 타려고 바우처를 보여주면서 앞 좌석이 없느냐고 하자 제일 뒤란다. 그러나 좌석 번호가 23D. 그나마 제일 뒤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막상 슬리핑 버스에 오르니 거의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통로는 한 사람이 지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필자의 자리는 2층이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다른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쳤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었다.
한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야 했다. 물론 베개와 담요는 각각 제공한다. 그렇지만 너무 좁다. 그리고 안전 장치도 없다. 키가 보통인 사람도 길이가 좁아서 제대로 팔을 펴기조차 어려웠다. 버스가 흔들리면 거의 떨어질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집 떠나면 어차피 고생이라고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을 다독여 보았다. 마침 같은 침대에 탄 사람이 날씬해서 다행이었다. 외국인들은 큰 신장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슬리핑 버스 승객 대부분이 현지인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그 효용성은 좋았다. 저녁 8시에 타서 이튿날 아침 6시에 도착을 하니 별도로 호텔을 예약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물론 루앙프라방에서 광씨 폭포도 보고 아침에 탁발 스님들의 의식을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은 아무래도 한국적인 요소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장소로 느껴졌다.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변호사와 AI
변호사와 AI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