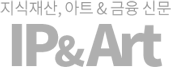한 소나무의 죽음
헨리 데이비드 소로
오늘 오후 페어헤이븐 언덕에 올라갔을 때 톱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후에 언덕의 벼랑에서 내려다보니, 저 아래 200m쯤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우람한 소나무 한 그루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소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 소나무는 우거진 소나무숲이 잘릴 때 남은 열두어 그루의 나무 중 맨 마지막까지 남은 나무였다. 그 소나무들은 지난 15년 동안 어린나무들만이 싹터 자라는 땅을 내려다보며 고독한 위엄 속에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난쟁이 인형처럼 나무 두께보다 더 길 것 같지 않은 동가리톱으로 자르는 모습은 이 고귀한 나무의 밑동을 갉아 먹고 있는 비버나 곤충처럼 보였다. 나중에 가서 재보니 이 나무의 높이는 30m나 되었다. 이 읍에서 자라는 가장 큰 나무 중 하나일 이 나무는 화살처럼 미끈하게 뻗었으며 언덕 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었다. 나무의 수관 옆으로는 얼어붙은 콩코드강과 코낸텀 언덕이 보였다.
나는 언제쯤 나무가 쓰러지나 주의 깊게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톱질을 멈추더니 나무가 기우는 방향의 톱질한 곳을 도끼로 찍어서 조금 더 틈을 벌린다. 나무가 더 빨리 쓰러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톱질을 계속한다. 이제 나무는 틀림없이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4분의 1쯤 기울어져 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나무가 꽝하고 쓰러지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무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과 똑같은 각도로 서 있다.
나무가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15분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쓰러지기 전의 상태에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마치 한 세기 동안은 더 서 있을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말이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솔잎 사이로 바람이 살랑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 나무는 숲의 나무이며, 머스키타퀴드 강변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무 중 가장 위풍당당한 나무이다. 솔잎으로부터 은빛 광택 같은 햇빛이 반사되고 있다. 접근을 불허하는 나무의 아귀들은 아직도 다람쥐가 집을 지을 만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나무 이끼 중 그 어느 것도 이 나무의 돛대 같은 줄기를(고물 쪽으로 기울어진 이 돛대에 대해 선체의 역할을 언덕이 하고 있다) 떠나지 않았다.
자, 이제 운명의 순간이다.
나무 밑에 있던 인형 같은 인간들이 범죄 현장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죄를 저지른 톱과 도끼를 내동댕이친 채 말이다. 아주 서서히 그리고 장엄하게 나무가 움직인다. 그 모습이 이 나무는 여름의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며, 소리 없이 공중에 있는 자신의 원위치로 돌아갈 것만 같다.
이제 나무가 쓰러진다.
쓰러지면서 언덕 비탈에 바람을 보내고는 계곡에 있는 자신의 잠자리,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자리에 눕는다. 전사처럼 자신의 녹색 망토로 몸을 감싸면서 깃털처럼 부드럽게 눕는다. 서 있는 것이 이제는 싫증이 난다는 듯 자신의 구성분자들을 흙으로 돌려보내며 말 없는 기쁨으로 지구를 감싸 안는다.
그런데 들어보라.
이 광경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낭떠러지의 바위 쪽으로 이제 귀를 멍하게 할 정도의 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나무마저도 죽을 때는 신음을 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무는 땅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구성원소를 흙과 뒤섞는다.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하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말이다.
나는 언덕을 내려가서 나무의 크기를 재보았다.
톱질한 부분의 지름은 1.2m가량이고 길이는 30m가량이었다. 내가 그곳에 이르기 전에 나무꾼들은 도끼로 나뭇가지들을 이미 반쯤이나 쳐내고 있었다. 아름답게 가지들을 뻗치고 있던 나무의 수관 부분은 마치 유리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산산조각이 되어 언덕 옆에 흩어져 있었고,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1년 정도 자란 어린 솔방울들은 뒤늦게 그리고 헛되이 자비를 호소하고 있었다. 나무꾼은 이미 도끼로 나무의 길이를 재고는 몇 개의 판자를 잘라낼 수 있는지 표시를 해놓고 있었다.
소나무가 이제까지 공중에서 차지했던 자리는 앞으로 200년간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소나무는 이제 단순한 목재가 되었다. 나무꾼은 하늘의 공기를 황폐케 한 것이다. 봄이 와서 물수리가 머스키타퀴드 강변을 다시 찾아올 때 그는 소나무 위에 자신이 늘 앉던 자리를 찾으려고 허공을 헛되이 맴돌 것이다. 그리고 솔개는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만큼 높이 솟았던 나무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리라.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200년이나 걸린 나무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뻗어올라 마침내 하늘에까지 도달했던 나무가 오늘 오후 사라져버린 것이다. 소나무 꼭대기 부분의 어린 가지들은 이번 정월의 따뜻한 날씨를 받아들여 한창 부풀어오르고 있지 않았던가?
왜 마을의 종은 조종(弔鐘)을 울리지 않는가?
내 귀에는 아무런 조종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마을의 거리에 그리고 숲속의 오솔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이지 않는다. 다람쥐는 또 다른 나무로 뛰어 달아났고 매는 저쪽에서 빙빙 돌다가 새로운 둥지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나무꾼은 그 나무의 밑동에도 도끼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출처=《시민의 불복종》, 강승영 옮김, 은행나무 刊)

Henry David Thoreau
Death of a Pine Tree
by Henry David Thoreau
This afternoon, being on Fair Haven Hill, I heard the sound of a saw, and soon after from the Cliff saw two men sawing down a noble pine beneath, about forty rods off. I resolved to watch it till it fell, the last of a dozen or more which were left when the forest was cut and for fifteen years have waved in solitary majesty over the sproutland. I saw them like beavers or insects gnawing at the trunk of this noble tree, the diminutive manikins with their cross-cut saw which could scarcely span it. It towered up a hundred feet as I afterward found by measurement, one of the tallest probably in the township and straight as an arrow, but slanting a little toward the hillside, its top seen against the frozen river and the hills of Conantum. I watched closely to see when it begins to move. Now the sawyers stop, and with an axe open it a little on the side toward which it leans, that it may break the faster. And now their saw goes again. Now surely it is going; it is inclined one quarter of the quadrant, and, breathless, I expect its crashing fall. But no, I was mistaken; it has not moved an inch; it stands at the same angle as at first. It is fifteen minutes yet to its fall. Still its branches wave in the wind, as if it were destined to stand for a century, and the wind soughs through its needles as of yore; it is still a forest tree, the most majestic tree that waves over Musketaquid. The silvery sheen of the sunlight is reflected from its needles; it still affords an inaccessible crotch for the squirrel’s nest; not a lichen has forsaken its mast-like stem, its raking mast - the hill is the hulk. Now, now’s the moment! The manikins at its base are fleeing from their crime. They have dropped the guilty saw and axe. How slowly and majestically it starts! as if it were only swayed by the summer breeze, and would return without a sigh to its location in the air. And now it fans the hillside with its fall, and it lies down to its bed in the valley, from which it is never to rise, as softly as a feather, folding its green mantle about it like a warrior, as if, tired of standing, it embraced the earth with silent joy, returning its elements to the dust again. But hark! there you only saw, but did not hear. There now comes up a deafening crash to these rocks advertising you that even trees do not die without a groan. It rushes to embrace the earth, and mingle its elements with the dust. And now all is still once more and forever, both to eye and ear.
I went down and measured it. It was about four feet in diameter where it was sawed, about one hundred feet long. Before I had reached it the axemen had already divested it of its branches. Its gracefully spreading top was a perfect wreck on the hillside as if it had been made of glass and the tender cones of one year’s growth upon its summit appealed in vain and too late to the mercy of the chopper. Already he has measured it with his axe, and marked off the millions it will make. And the apace it occupied in the upper air is vacant for the next two centuries. It is lumber. He has laid waste the air. When the fish hawk in the spring revisits the banks of the Musketaquid, he will circle in vain to find his accustomed perch, and the hen-hawk will mourn for the pines lofty enough to protect her brood. A plant which it has taken two centuries to perfect, rising by slow stages into the heavens, has this afternoon ceased to exist. It sapling top had expanded to this January thaw as the forerunner of summers to come. Why does not the village bell sound a knell? I hear no knell tolled. I see no procession of mourners in the streets, of the woodland aisles. The squirrel has leaped to another tree; the hawk has circled further off, and has now settled upon a new eyrie, but the woodman is preparing to lay his axe to that also.
----------------------------
〈한 소나무의 죽음〉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1817~1862)의 짧은 수필이다. 서사시 혹은 산문시처럼 느껴지는 것은 문장 속에 시적 음성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 음성은 메마르지 않다. 연극무대 위에서처럼 낮고 굵다. 단단하다.
산책길에 소로는 톱질 소리를 우연히 듣는다. 다가가서 보니 키 큰 소나무였다. 우거진 솔숲이 잘리고 남은 12그루 나무 중 맨 마지막 나무가 ‘고독한 위엄으로’ 서 있었다.
그는 두 나무꾼을 ‘난쟁이 인형’, 나무 밑동에 기생하는 ‘비버’ ‘곤충’에 비유한다. 이 표현에 위트를 못 느끼는 이유는 소로의 ‘인간’에 대한 묘사가 정확해서일지 모른다.
톱질을 멈춘 나무꾼이 톱질한 곳을 도끼로 찍었다. 나무가 더 빨리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꽈당하고 쓰러지기를 기다렸지만 놀랍게도 나무는 1cm도 안 움직였다. 무려 15분 동안을 서 있었다. 쓰러지기 전의 나무를 소로는 깊게 응시했다. 나무의 늠름함은 ‘마치 한 세기 동안은 더 서 있을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드디어 나무가 쓰러졌다. 소로는 그 모습을 ‘서서히 그리고 장엄하게 움직인다’ ‘전사처럼 녹색 망토로 몸을 감싸면서 깃털처럼 눕는다’로 표현했다. 나무를 의인화한 표현이 감동적이다. 반면, 나무꾼 두 사람(‘나무 밑에 있던 인형 같은 인간들’)은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비꼬았다. 죄를 저지른 톱과 도끼는 내동댕이친 채로 말이다.
소로는 나무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리고 ‘왜 마을은 조종(弔鐘)을 울리지 않는가?’라고 절규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슬픔, 나무의 죽음에 동조하지 않는다. 목석같은 일상(日常)은 나무가 쓰러지기 전과 후가 그대로다. 소로는 신(神)의 침묵을 원망했을까.
〈한 소나무의 죽음〉은 소로의 작품집이나 문학지에 실린 글이 아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 실렸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죽기 바로 전해까지 25년간 일기를 썼다. 이 글은 ‘19세기에 쓰인 위대한 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월든》(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생활한 2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나오기 전인 34세(1851) 무렵 쓴 글이다. 1854년 《월든》 초판이 티크노어 앤 필즈 출판사에서 출판됐으니 〈한 소나무의 죽음〉이 《월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상가이자 시인, 자연에 동화되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꿈꾼 자유인이었다. 소로는 《월든》에서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여라. 계산은 엄지손톱에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다. ‘옛날 농경시대로 돌아가 느림의 삶을 살자’는 구호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처음엔 귀담아듣지 않았다. 사후 20세기 생태환경운동의 원천으로 재발견되어 수많은 사상가와 환경운동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소로의 대표작인 《시민의 불복종》(1849)에서 그의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 p.21, 《시민의 불복종》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변호사와 AI
변호사와 AI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