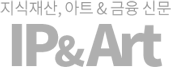|
|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의 한 광장. |
유럽의 시리아! 알바니아는 목가적이다. 사회 분위기는 여유가 있고 후진성이 곳곳에서 보인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횡단이 이루어진다. 운전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몬테네그로에서 산길을 따라 알바니아로 향했다. 관광가이드가 “하이웨이로 간다”고 했다. 산속에 고속도로가 있다니 신기하게 느껴졌다. 알고 보니 중앙선 없는 산길. 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었다.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했다. 오른쪽은 낭떠리지, 왼쪽은 능선이었다. 높은 산속의 길이어서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일행 중 한 명이 “이 길이야말로 아드리아 해의 자동차 순례길이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이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좀 더 지나자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이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웨이라고 하는 모양이었다.
 |
| 티라나 도심의 모습이다. |
알바니아는 마약, 무기밀매 등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다. 그러나 의외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발칸 국가 중 가장 먼저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옛 비잔틴 제국의 근거지였단다. 당시 무역이 활발하였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유소 등도 실제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지 자금세탁용으로 간판만 걸어 놓는 경우가 태반이란다. 그래서 “유럽의 시리아”라고 불린다. 국토 크기는 한국의 4분의 1. 인구도 300만 명 정도.
놀라운 사실은 알바니아인으로서 외국에서 살고있는 인구가 거의 1,500만명에 이른다. 공산독재를 피하여 해외로 나간 모양이다. 역사적으로 알바니아는 오스만의 통치를 받아왔다. 또한 합스부르크의 통치를 거쳤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편입되지는 않았다. 흥미롭게도 알바니아는 그간 쇄국정책을 취하였다. 40년간의 독재, 쇄국정치 등으로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
| 알바니아 독재정권 시절, 지하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든 지하 벙커. |
한때 일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이다. 1997년에는 국가파산에 이르렀다. 전 국민의 60%가 피라미드 다단계에 관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급기야 시민쿠테타가 발생하였다. 진압에 투입된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떠뜨리지 않고 이탈리아에 망명을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마침내 시민 쿠데타가 성공했다. 이후 민주정권이 들어섰다. 당시 일부 무장 시민들이 마피아를 조직하여 무기를 밀수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상당수가 마피아라는 말이 있다. 빈부차이도 심하다. 어쨌든 필자의 눈에 비친 알바니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목가적이었다. 시가지 역시 수수하고 아담하게 보였다.
 |
| 알바니아 태생인 성녀 테레사 수녀상 앞에 선 필자. |
이어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로 향했다. 수도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다. 시내 중심가에는 큰 광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산국가의 전형이었다. 여기에 정부청사 등이 위치했다. 특이한 점은 독재정권이 방커를 만들어 지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큰 벙커는 그 크기가 5층 높이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광장 옆에는 독재정권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하여 평화의 종이 건립되어 있었다. 조금 지나 대통령령 관저가 보였다. ‘블록’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공산당 고위간부들이 있는 곳이란다. 이 곳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는데 지금도 수영장이 있는 빌라 등 멋진 저택이 있다.
 |
| 평화의 종 |
4성급 호텔에 숙박했다. 외관부터 깔끔해서 좋았다. 식당도 12층에 위치하여 전망도 좋은 편이었다. 식사 후에 호텔 밖 도심 주변을 걸어보니 낙후된 느낌과 함께 잘 정돈되지 않았으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좀 더 걸어 보고 싶였지만 갑자기 마피아가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가까운 이탈리아 시실리가 마피아의 본산이 아닌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숙면을 취하기로 하였다. 너무나도 타이트한 일정이어서 체력 관리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알바니아의 밤은 마냥 여유로웠다.
 |
| 도심의 쌍둥이 빌딩. LG에서 지었을까. |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cusco, past, future & now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open, collective intelligence & OSS by IP&ART(김승열 RICHARD SUNG YOUL KIM한송온라인컨설팅센터대표이사HSOLLC)
 변호사와 AI
변호사와 AI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
AI Present and Future in the Legal Fields Under the RCEP